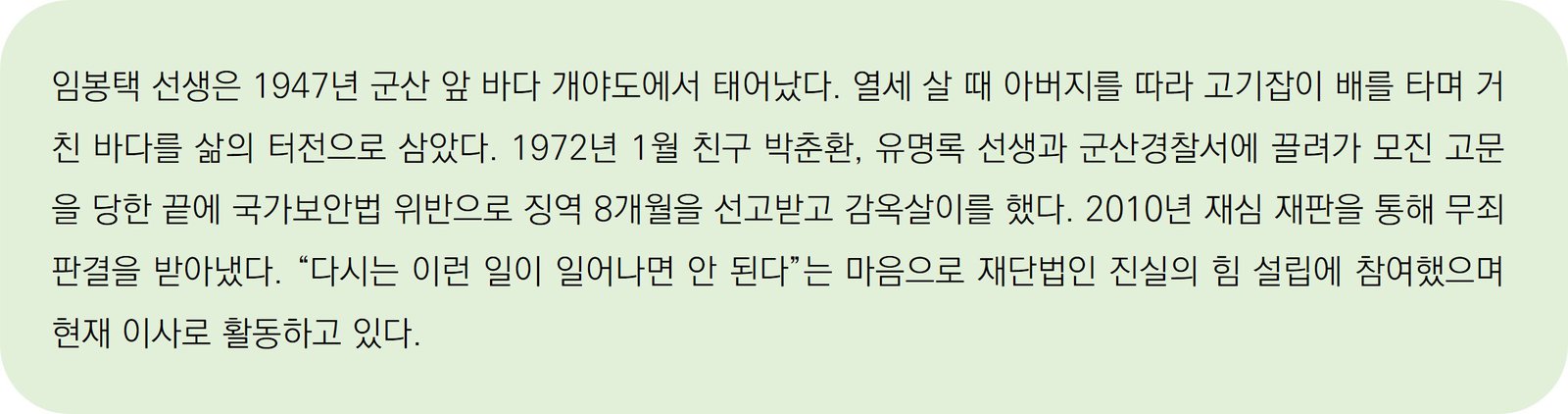
상여와 돼지고기
내 고향 개야도는 1960~70년만 해도 바다에 나가서 죽거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잔치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초상집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돼지 한 마리는 꼭 잡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명절 때 아니면 고기 먹기가 힘들 때였다. 초상이 나면 젊은이들은 산에 가 땅을 파서 시신 모실 곳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은 상여를 꾸민다. 시신을 올려 놓을 상여대를 만들면, 여인들은 상여 꽃을 만든다. 시신 모실 꽃상여를 만들어 놓고 동네 한복판 공터에서 “잔치 아닌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왜 “잔치 아닌 잔치”냐? 부모 잃은 가족들은 울고불고 야단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돼지고기에 떡까지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잔치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시신이 집에서 나와 상여에 모셔지면 상여가 시작된다. ‘상여 앞잡이’라고 하는 소리꾼이 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메긴다. 소리꾼이 메기는 소리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이제가면 언제나 오나 오실 날짜나 일러 나 주오”
그러면 상여꾼들이 후렴을 한다.
“허허허허허허허 허이야루 넘자 허~허~허”
이렇게 후렴이 끝나면 소리꾼은 또 소리를 한다.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정들은 내 님아 나 혼자 두고 가지를 마오.”
가족들은 물론이고 구경꾼들까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구슬프게 소리를 메기는 ‘상여 앞잡이’ 소리꾼이 있었다.
상여를 메고 후렴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에 6명씩 12명인데, 상주들은 후렴을 크게 해달라고 앵병(옹기) 소주를 바가지에 따라서 돼지고기하고 마구 먹인다. 왜냐하면 상여꾼들이 얼큰하게 취해야 부끄러움 없이 목청껏 후렴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여를 놀다가 시신이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면, 상여꾼들은 상여를 맨 채로 동네사람들에 절을 한다. 망자가 동네사람들과 마지막으로 하직인사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시신은 북망산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여가 가는 길 앞에는 만사라는 깃발이 있다. 여러가지 색깔의 천을 이어 깃발을 만들고 긴 대나무 끝에 매달아 들고 상여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만사는 어른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들고가는 풍습이 있었다. 이 깃발을 서로 들고 가려고 야단들이었다. 왜냐하면 깃발을 들고 산까지 가면 돼지고기 한 덩어리와 시루떡 한 바라기(한 덩이)를 주기 때문이다.
시신을 땅속에 잘 모셔 놓고 봉분 쌓는 일이 끝나면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세 상 또는 네 상을 차려 놓았다. 그 상 위에는 초상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만 갖다가 차려 놓기 때문에 상여꾼들의 호기심이 집중됐다. 산신제가 끝나기 무섭게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먼저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것이다. (계속)
